나누고 싶은 이야기

책은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맥질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결코 반가운 벗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밑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됩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그리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飛躍)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三讀)입니다. 먼저 텍스트를 읽고, 다음으로 그 텍스트를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 텍스트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 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독서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읽고 자기가 대면하고 있는 세계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와 맺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관련성을 성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독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갇혀 있는 문맥, 우리 시대가 갇혀 있는 문맥을 깨트리고, 드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자유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정에서 길어 올려야 하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애정입니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더 좋은 책, 더 좋은 왕도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고뇌와 성찰의 작은 공간인 한 언젠가는 빛나는 각성으로 꽃피게 마련입니다.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독서는 만남입니다. 성문(城門) 바깥의 만남입니다. 자신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서는 자신의 확장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남인 한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마치 바다를 향해 달리는 잠들지 않는 시내와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이 모이고 모여 어느덧 사회적 각성으로 비약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시대가 갇혀 있는 문맥(文脈)을 깨트리고, 우리를 뒤덮고 있는 욕망의 거품을 걷어내고 드넓은 세계로 향하는 길섶에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굳이 새해의 일출을 보기 위해 동해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출은 도처에 있습니다. 반가운 만남과 성찰을 쌓아가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찬란한 일출은 있습니다.
새해의 빛나는 성취를 기원합니다.
- 신영복 님의⟪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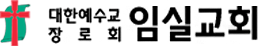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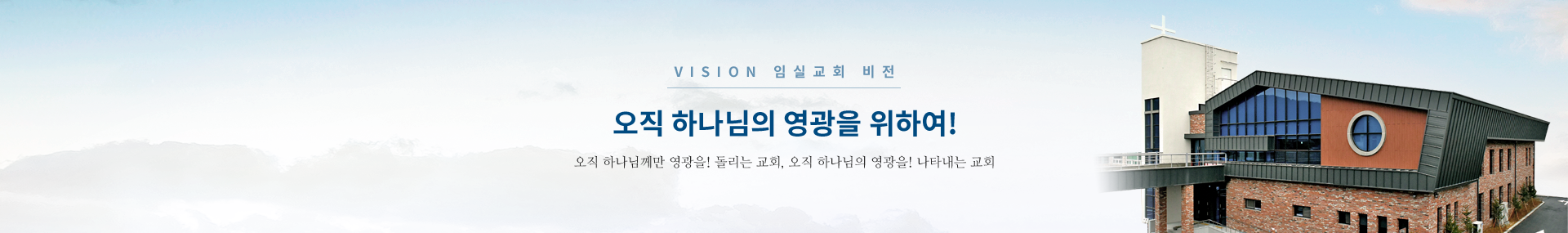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