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고 싶은 이야기

“예끼, 이 양심에 털 난 사람 같으니라고.”
“양심은 어디 엿 바꿔 먹었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어렸을 때는 매일 일상적으로 듣던 말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양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 대화에서 사라졌다. 왜일까?
어떤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회적으로 통용되던 단어가 사라지는 이유는 그 단어를 대체할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거나
그 단어가 묘사하는 존재나 상황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윈의 사도들⟫에서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스티븐 핑커는 이러한 현상을 그 자체가 본래 언어가 작동하는 방법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쓰레기 수거’라는 단어가 ‘위생관리’로 바뀌고, 또다시 ‘환경 서비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변소’는 ‘욕실’과 ‘세면실’을 거쳐 ‘화장실’로 바뀌었고, ‘깜둥이’가 ‘흑인’으로,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단어 혹은 용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존재감을 잃어가는 현상은 사회, 문화, 그리고 기술의 변화를 반영한다.
언어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언어 변천을 견인하는 요인들 중에서 세대교체와 기술 발전은 특별히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 사회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자취를 감추는 과정에서 그를 대체한 말이 있는가 생각해보았다.
기껏 떠오르는 말은 ‘쪽팔리다’라는 비속어 정도였다. 충북대 국어국문학과 조항범 교수에 따르면,
이 말은 1980년에 출간된 소설가 황석영의 ⟪어둠의 자식들⟫에서 불량배들이 사용하는 은어로 소개되어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전에 등재되었다.
어느덧 비속어와 욕설이 일상어로 쓰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요즘엔 남녀노소 누구나 ‘쪽팔려’를 대수롭지 않게 내뱉는다.
어떤 면에서는 ‘쪽팔리다’가 양심의 빈 자리를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양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은 지는 퍽 오래되었다.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내 안의 깨끗한 무엇’,바로 양심이다. 대한민국 헌법 2-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양심은 내심의 가치적 또는 윤리적 판단은 물론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도 포함하는 심성으로서 그 형성과 유지에 이어 실현에도 자유가 주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다. 양심을 규제하면 남몰래 어기며 내심 불편하더라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들키지만 않으면.
그러나 양심에 자유를 허락하면 모든 책임이 다 내게 쏟아진다. 그래서 훨씬 더 무겁고 무섭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명예는 밖으로 나타난 양심이며, 양심은 안에 깃든 명예이다”라고 설명한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법이다. 모두 수시로 제 발 저리는 세상을 꿈꾼다.
양심과 명예가 살아 숨 쉬는 그런 세상.
- 최재천 님의⟪양심⟫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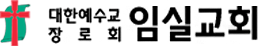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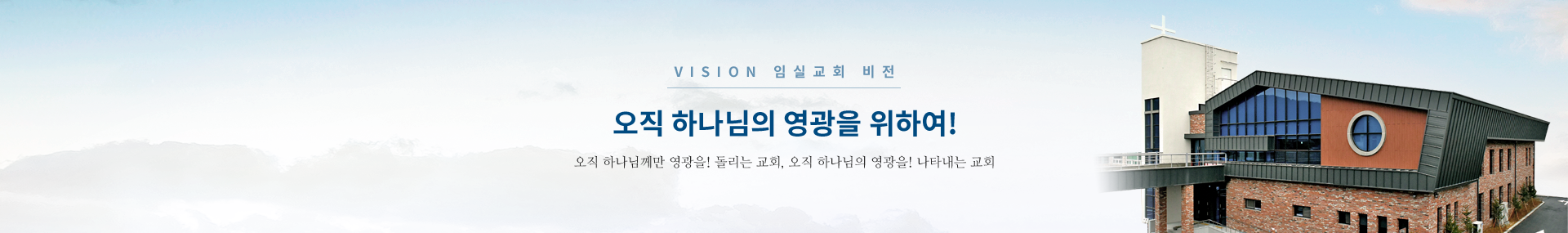
댓글